<<바다 건너 샌들>>을 펴내며

열한 편의 단편을 모아 책을 낸다. 소설가가 책을 내는 일은, 작가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자 검증이기도 하다. 하나의 문장은 물론 토씨 하나, 쉼표와 줄 간격조차 내러티브에 의미를 표하려는 의도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터다. 대충 넘어간다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고는 소설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다. 그만큼 소설은 치밀하게 직조된 형식이다. 형식은 형식이되 재미와 감동을 동반한 형식이다. 함부로 책을 낼 수 없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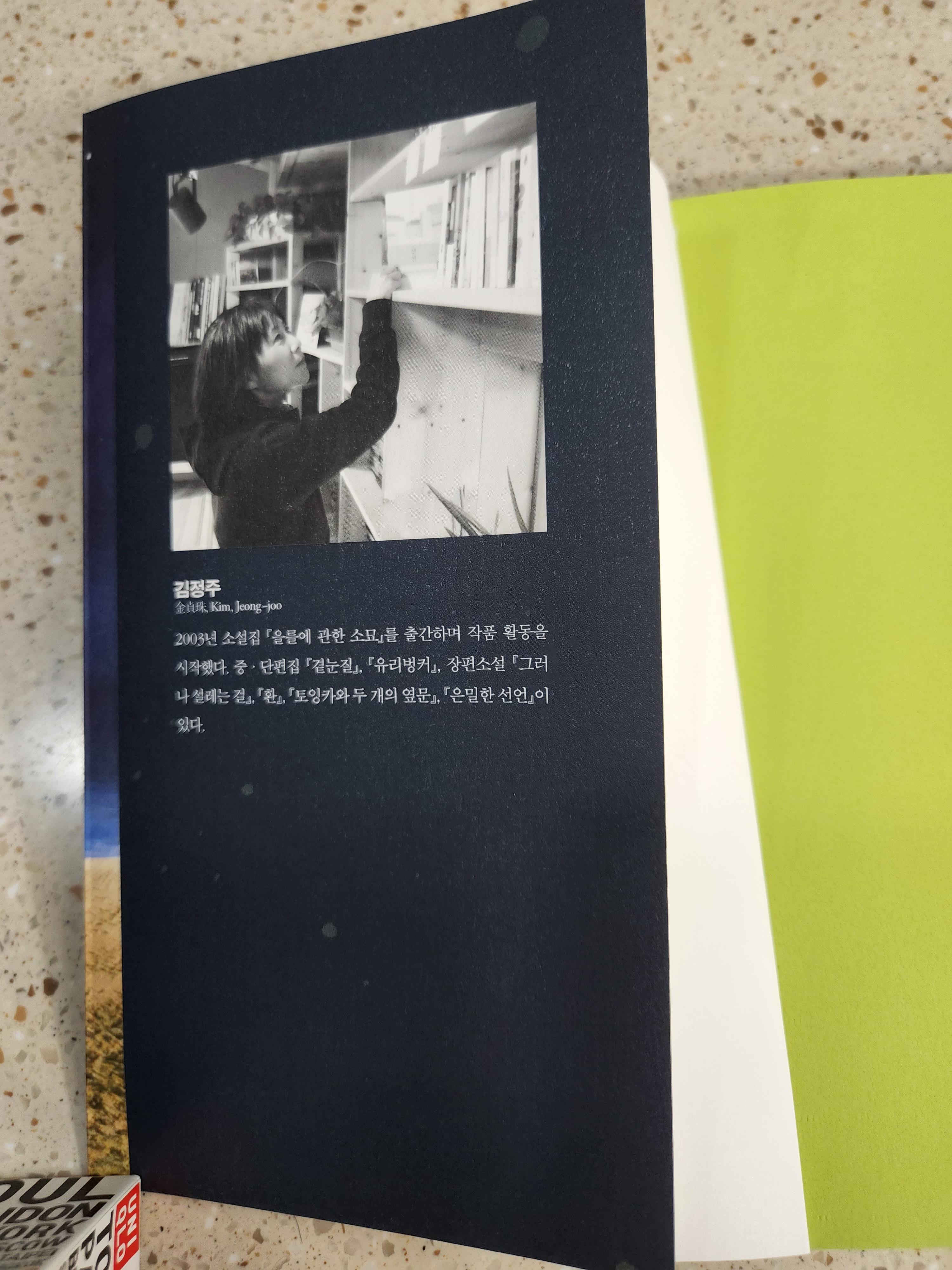
그럼에도 『바다 건너 샌들』을 냈다. 졸작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어떤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겸손의 표현으로 졸작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 말처럼 위선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독자 중 누군가, 졸작이라고 말한 작가를 향해 “졸작이라고 하더니 진짜 졸작이네요” 라고 한다면 그 작가는 화를 내고 말한 사람과 인연을 끊으리라 짐작한다. 자신의 전부를, 피톨을 튀며 적어나간 글을, 어찌 졸작이라는 말로 비하시킬 수 있을까. 한심한 레토릭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됐든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당당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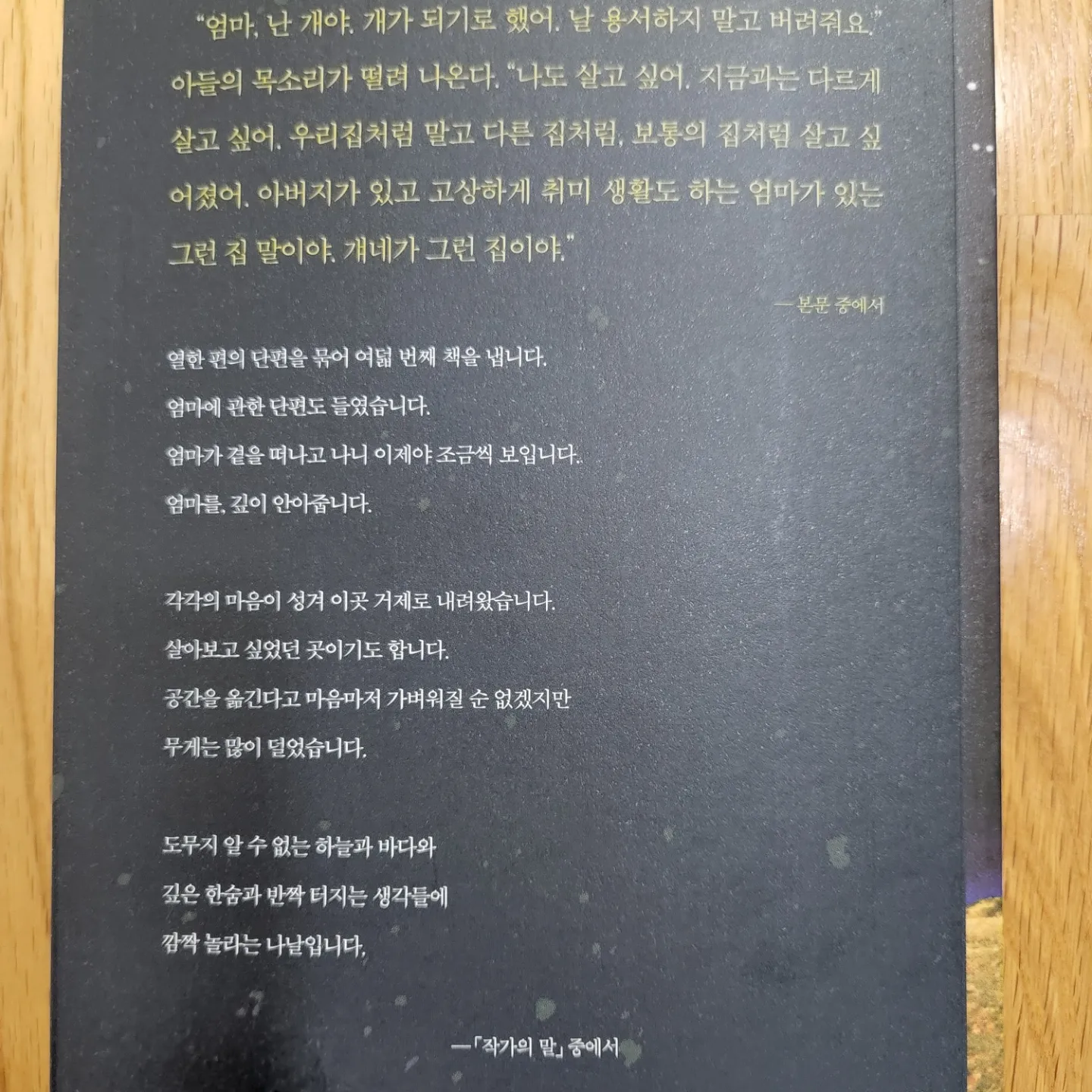
열한 편의 단편 제목을 소개한다.
이월 상품
위생국가
밤이 오면
시가 몸이 될 때
바다 건너 샌들
재건축에 붙임
푸른 방의 몰리
광자랍니다
원더풀 데이
제 이름을 가지세요
시내
우선 표제작 「바다 건너 샌들」은 남편과 자식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동네에 버려진 유기견을 상징적으로 병치시킨 작품이다. 「위생 국가」는 가장에 의해 ‘미소 띤 폭력’에 노출된 가족 구성원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국가/사회가 위생성만을 요구할 때 어떤 파장과 결과가 올지를 섬뜩하게 드러낸다. 「시내」는 작가의 엄마가 죽음의 혼돈 속에서 툭툭 끊기다 이어지는 기억을, 순차적 시간이 아닌 의식의 시간으로 그려낸다. 짧은 단편적 이미지는 SNS에 쓰는 글 작업의 기법을 연상시킨다. 그 외에도 낙태에 관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 윤리 사이에서 갈등을 그린 작품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문학이 오염되는 과정과 그로 인해 예술의 진정성을 묻는 작품도 있다. AI가 소설을 쓰고, 첨단화된 기기에 의해 직장을 잃은 남자의 사연도 시니컬하게 나온다. 다수의 작품은 자본과 은밀하게 진행되는 폭력의 관계를 밀도 있게 때론 희화화하며 진행된다.
열한 편의 근간을 이룬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왜, 어떤 이유로 훼손되며, 훼손되는 그 환경에서 인간의 존재는 어디까지 정의할 수 있나 질문을 던진다.